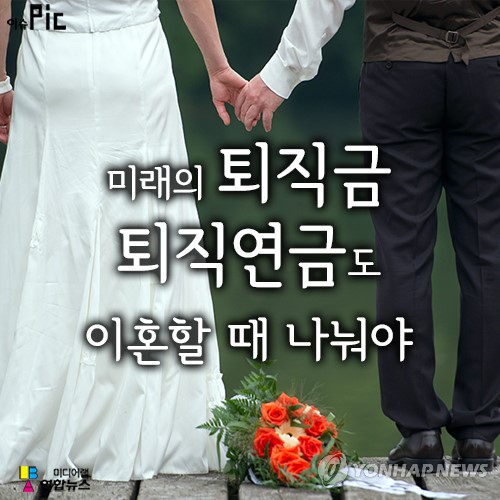|
| 대법 "미래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여년 만에 이혼할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부간 역할도 달라지는 등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결정이다. 앞으로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퇴직금 어떻게 나누나 = 이혼소송 당사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할 때 얼마를 받게 될지 소송단계에서 알 수 없다. 때문에 대법원의 종전 판례는 금액과 수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퇴직급여는 이혼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추정해 이를 나눠 가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통상적으로 2심 재판의 변론이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던 사건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인 아내(44)와 연구원 남편(44)은 1997년 결혼했고 자녀 둘을 낳았다. 아내의 월수입은 280만원, 남편의 월수입은 460만원이었다. 이들은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모두 아내 40%, 남편 60%라고 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부부의 결혼기간과 양측의 월 소득액, 직업, 가사노동과 육아에 힘을 쏟은 비율 등이 고려된다.
이들 부부가 2심 변론 종결시점인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받을 퇴직금이 아내는 1억1천만원, 남편은 4천만원이라고 보면, 앞으로 아내는 40%인 6천만원, 남편은 60%인 9천만원을 나눠 가지게 된다.
다만 재산분할비율은 특정한 계산 공식이 존재하지 않고 결혼기간이나 재산형성에 부부 쌍방이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이혼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은 = 이혼할 당시 이미 퇴직해 매달 연금 형식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배우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남은 여명을 알 수 없어 얼마를 받게 될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재산과 별도로 기여도 등을 따져 분할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의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선고된 또다른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로 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가 1994년 결혼해 2011년 이혼소송을 냈다.
아내는 가정주부이고, 경찰공무원이었던 남편은 2006년 6월 정년퇴직해 매달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남편이 받는 연금의 분할비율을 50대 50으로 결정하면 둘이 이혼할 경우 아내는 앞으로 남편이 받는 연금의 절반인 10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혼판도 바뀌나 =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의 본래 취지는 두 사람이 혼인해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기준이 확립된 지 20년이 흐르면서 이런 취지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부부 재산에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황혼이혼이 늘어난 요즘은 퇴직금, 퇴직연금이 중요해졌는데, 기존 판례에서는 이를 분할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미래의 퇴직급여라도 법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이나 미국은 이 연금을 법으로 정해 나눠주도록 하고 있고, 일본도 미래의 퇴직급여 분할을 입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서울중앙의 양정숙 변호사는 "그동안 부부 재산의 구성은 달라졌는데 재산분할제도는 이를 못 따라온 측면이 있다"며 "판례 변경으로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해진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경제활동을 해온 쪽은 이혼 후에도 연금으로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는데 비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정주부 등은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shiny@yna.co.kr